1.
이사 후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삼면에 큰 창이 있어 해가 잘 들어온다는 것이다.
햇빛과 함께 지저귀는 새소리로 아침이 시작된다.
하지만 난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다. 정오가 되어 겨우 일어나는 내게 싱그러운 이 아침은 좀 부담스럽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 너머 잠자리에 누웠다. 어슴푸레 해가 뜨고 있었다. 그리고 잠들려는 찰나,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정말 끊질기게 쉬지 않고 노래했고, 나는 괴로웠다.
그래서 외쳤다. 다른 의도는 없었고, 잠결에 나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다.
이 새새끼들!
2.
다음 날, 새가 창문에 똥을 샀다.
하필 2cm 밖에 안 열리는 창문 한가운데 보란 듯이.
각종 도구를 사서 겨우 지웠다. 그마저도 깨끗이 지워지진 않았다.
3.
앞으로 조류 선생님께 예를 갖추고 살기로 했다.
사실 새는 새끼라고 불러도 된다고 배웠는데, 뉘앙스가 문제였나 보다.
뒤늦게 반성했지만 이분들은 만만한 분들이 아니셨다.
창 밖 어린 페퍼민트 화분에 털 빠진 검정 깃털을 놓고 가졌고 (면도칼 넣은 편지봉투를 받은 기분이었다),
난간 위에 앉아 방충망을 뚫을 기세로 째려보고 가셨으며,
종종 창문으로 돌진해 겁을 주시기도 하셨다.
뿐 만 아니라, 집 앞 쓰레기장을 부리 난도질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며,
가끔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 올라 히치콕의 영화를 연출하기도 하셨다.
평소보다 심한 새소리와 고양이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열 마리 정도의 새가 계단에 사는 아기 고양이 가족들을 다 쫓아내며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걸 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분을 도발했다.
저 새새끼들이!
4.
알고 보니 까치는 종로구의 상징 새였다.
내가 이사 오기 전부터 종로구의 권력을 잡고 새 답게
다음 날, 어김없이 또 창문에 새똥을 갈기고 갔다. 심지어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행히 장마철이었다. 엄청난 비가 왔다.
비가 그만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내심 새똥이 지워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52일간 거친 비바람에도, 창문의 새똥은 크기만 작아졌을 뿐 그대로다.
5.
이사 온 지 두 달이 지났다.
여전히 햇빛과 함께 지저귀는 새소리로 아침이 시작된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긴 하지만, 기상 시간이 조금 빨라졌고,
새를 봐도 놀라지 않으며,
힘들게 치워봤자 또 그럴 거라는 생각에 창문의 새똥은 그냥 두고 있다.
새 집에 이사 온 지 두 달째, 아마 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The bird pooped in the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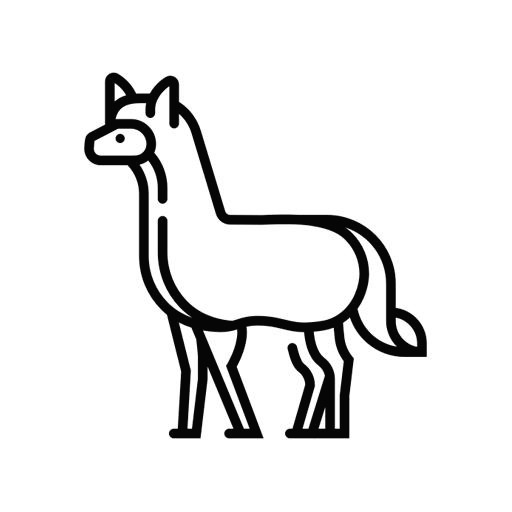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