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중하게 빚은 흙 속에서 그릇을 탄생시키는 것은 ‘깎기’다.
너무 게으름을 피웠다. 잔과 받침을 만들기 위해 처음 흙을 빚은 게 벌써 세 달 전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춥다는 핑계로, 그리고 방학으로 인해 긴 시간을 건너뛰는 동안 빚어놓은 기물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선생님의 손길로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단하다.
단단한 흙을 깎는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 긁는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이다. 슥슥. 슥슥. 하염없이 깎다 보니 먼지 같은 고운 흙이 쌓인다. 한 주면 끝날 일을 삼 주 동안 붙잡고 있다. 손가락이 아파 멈추고 나서야 겨우 기물이 모양을 갖췄다.
완성인지, 미완성인지 모를 기물을 가마가 있는 공방으로 보내버렸다. 어차피 굳어서 깎이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련이다. 하지만 자꾸만 지나버린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 몰려온다.
Pottery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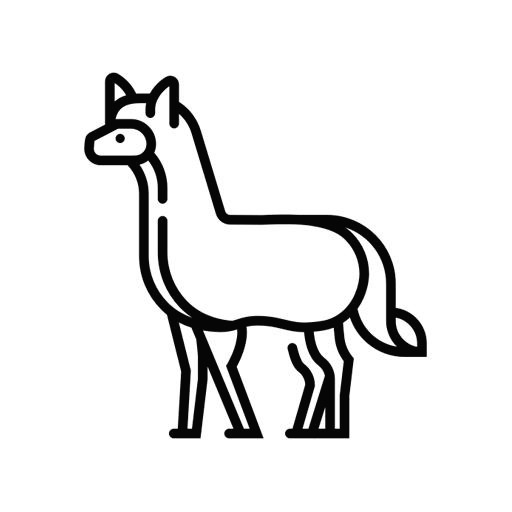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