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동 언덕 꼭대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깝게 서울역과 남산이 보였고, 저 멀리 인왕산이 솟아있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풍경이 좋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매가 없는 하얀색 내의에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은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네, 좋네요. 근데 저희도 여기 살아요. 후암동.”
“거긴 아니지.”
“네, 정확히는 갈월동이요.”
“갈월동도 아니지. 여긴 서계동이야.”
“그렇긴 하죠. 그래도 길 건너편이니까 이웃이죠.”
아저씨는 내 옆으로 와 함께 언덕을 내려다보셨다.
“난 여기 65년 살았어요.”
그 정도 세월이면 동네의 경계를 명확히 할 만했다.
전세살이 뜨내기로 2년마다 동네는 옮기는 나는 절대 알 수 없는 서계동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여기가 경치도 좋지만, 교통이 좋아.
저기 서울역까지 직선거리로 이삼백 미터 밖에 안될 걸? 여기서 못 가는 데가 없어.
근데 동네가 다 좋아도 너무 낡았어.”
실제로 집들은 꽤 낡아 보였다. 폐허가 된 빈집도 꽤 있는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싼 높은 빌딩 때문에 더 낡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기업 건물들과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병풍처럼 동네를 둘러싸고 있었다.
“저 아파트 짓기 전에는 여기서 청와대까지 다 보였어. 진짜 경치가 좋았는데…”
“여기만 개발이 안 된 거죠?”
“여기만 빼고 다 개발됐지. 이렇게 묶어 놔서 힘들어. 너무 낡아서 위험해. 여기 다 빈집들이잖아.
근데도 땅값이 너무 비싸. 평당 2500이 넘어. 비싸기만 하고 개발은 안 되고 살 수가 없다니까.
나 같은 늙은이들이야 그냥 살다가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가면 되지만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누가 여기 집 산다고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며 말릴 거야.”
다음에는 서계동이나 청파동에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하던 나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깜짝 놀랐다.
아저씨와 나는 다시 서울을 내려다봤다.
언덕 아래로 떨어지지 말라고 투명하게 막아놓은 아크릴 펜스 넘어 서울 풍경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여기다 돈을 60억 원 퍼부었는데, 쓸데없는 짓이지.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뭐해. 도움이 안 돼.
제대로 된 걸 해야지. 정치인들은 다 자기만 위하지. 여기 사는 사람들 위할 줄 몰라.”
투명 아크릴 펜스 아래 잘 정비된 화단에는 여름을 맞아 활짝 핀 패랭이꽃이 피어 있었고,
작은 관람대에는 서울역과 남산을 비롯해 근처까지 가는 길이 안내되어 있었다.
확실히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비는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지난번에 왔을 때 쌓여 있던 쓰레기와 그 쓰레기더미를 먹던 아기고양이가 생각나 잘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여기 개발돼서 아파트가 생겨도 걱정이긴 해. 우리 같은 원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떠나야 할 테니까.”
아저씨의 걱정을 뒤로하고 나는 인사를 드리고 만리시장 방향으로 언덕을 내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아저씨는 슈퍼에서 캔맥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았다.
언덕 위로 하늘이 맑고 파랬다.
The sky was clear and blue above the h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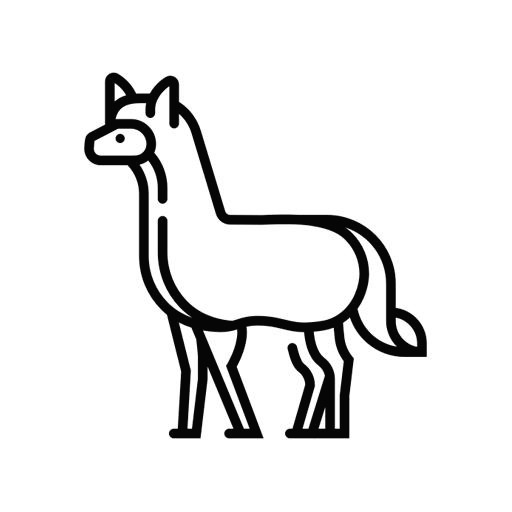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