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낮의 치앙마이.
몇 걸음 옮기지도 않았는데 온 몸이 땀에 젖어 끈적인다.
길을 걷다 보면 나무를 많이 만난다. 긴 잎사귀를 치렁치렁 드리운 나무. 밑둥 부터 여러 개의 가지가 서로 꼬아지듯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나무. 보도 블럭 사이로 수줍지만 매운 모습으로 자리 잡은 작은 식물들. 한 눈에 들이기 벅찬 아름드리가 길의 주인처럼 위엄 있게 자리한 모습도 본다.
치앙마이 올드타운은 건물과 식물의 조화가 멋스럽다. 드리운 그늘이 무색할 정도로 덥지만, 그 푸르고 거대한 생명체의 영역 안에서 왠지 숨통이 트인다.
지금 살고 있는 서울 갈월동에는 큰 나무가 드물다. 적산가옥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개발의 광풍이 가까스로 비껴가고 있는 동네지만, 긴 시간 동안 필지를 잘게 쪼개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서고 그 사이에 길을 내며 그나마 있던 나무들도 많이 잘려나갔을 터다. 옛 집들의 형태가 남아 있는 우리 동네의 골목길 풍경을 좋아하지만, 식물들이 없으면 어쩐지 쓸쓸하다.
다행히 큰 길에는 가로수가 있다. 고마운 존재지만, 그들은 줄 맞추어 태어나서 때마다 보살핌을 받는다. 스스로 땅의 주인이 되어 두텁게 자라난 품위를 찾기 힘들다.
치앙마이에 한바탕 소나기가 몰아치고 난 후였다. 구름이 아직 빗물을 다 떨쳐내지 못하고 몇 방울 씩 뚝뚝 가는 줄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사원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적당히 흐린 날씨에 녹음이 유난히 더 짙어 보였다. 거목은 빗물을 기분 좋게 빨아들인 모양이었다.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물방울을 튕겨냈다. 그 아래를 나는 머리를 조아리며 종종걸음으로 지나다녔다. 어깨며 머리로 후드득 물이 든다.
오래 묵은 길과 풍성한 수목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
태국을 애정하는 이유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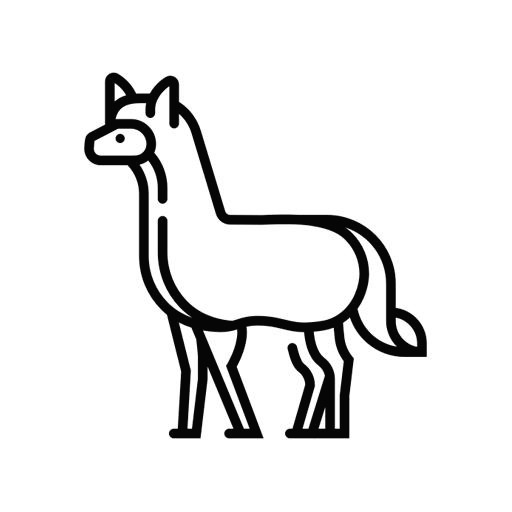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