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병원에 있을 때, 복대를 차고, 수액과 무통주사, 각종 약들을 매단 채 복도를 걸었다.
2.
항상 같은 자리에 뜨개 모자를 쓴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다. 북한산이 잘 보이는 창가 자리였다. 보통 할아버지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혼자 있는데, 할머니들은 꼭 같이 계셨다. 세 분이 앉아 계실 때도 있고, 두 분이 앉아 계실 때도 있었다. 아침, 점심, 저녁 복도를 돌 때마다 할머니들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복도는 한 바퀴를 다 돌아도 고작 300미터 정도로 길지 않았는데,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졌다. 아침에 뵈었을 땐, 병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 같았는데, 저녁에 뵈었을 땐 오랜 친구 같은 분위기가 됐다.
다음 날 아침, 복도를 돌 때도 할머니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거셨다.
“열심히 하네.” “운동해야 돼.” “많이 걸어.”
멋쩍은 웃음으로 대답을 하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았다. 그리고 마주쳤을 때, 좀 더 본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복대는 왜 했어?” “허리 다쳤어?” “뭘 주렁주렁 달고 있어?” “많이 아파?” “어디 아파?”
병명을 말씀드리자, 그런 건 별거 아니라며, 우린 둘 다 암환자라고 깔깔깔 웃으셨다. 젊으니까 금방 나을 거라며 열심히 운동하라고 격려도 해주셨다.
3.
병실마다 문 옆에 이름과 나이가 쓰여 있었다. 주로 비슷한 나이끼리 모여 있었다.
60대 이상 병실은 소란했다. 늘 대화나 통화 소리가 들렸고, 커튼을 젖힌 곳엔 선풍기와 수건, 빨래가 걸려 있기도 했다. 가끔 찐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맛있는 냄새가 나기도 했다. 그 병실 앞에선 할머니들이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서로 손을 꼭 맞잡은 할머니들도 있었다.
그에 반해 40대 이하 병실은 조용했다. 나도 고요를 깰 수 없어 바로 옆에 있는 보호자와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다. 밖에서 보면 커튼 쳐진 병실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적막이 느껴졌다.
4.
할머니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난 다음 바퀴는 차마 할머니들 자리까지 가지 못한 채 돌아왔다. 다음 질문은 아무래도 좀 더 내밀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불편한 건 아니지만 왠지 쑥스러웠다.
퇴원할 때, 서로 화장실 문을 잡아준 적이 있는 옆 침상 환자에게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그냥 나왔다.
다정한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난 어떤 사람이 될까 문득 궁금해졌다.
Sweet grandm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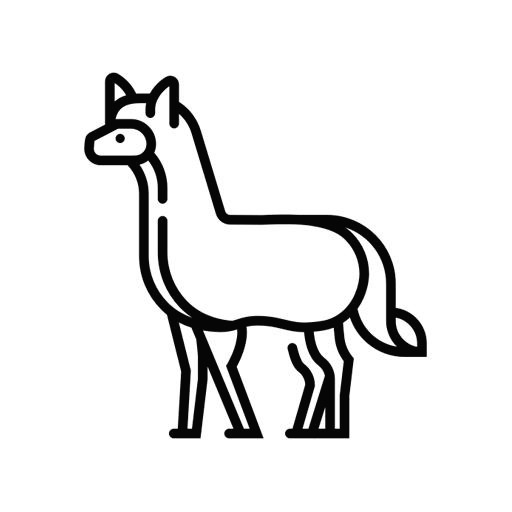





댓글